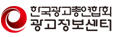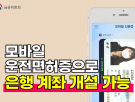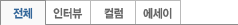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방송광고 사전 심의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70년대부터 그때까지 모든 방송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고 통과해야만 온에어가 가능했다.
수많은 미디어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지금 세대에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옛날얘기일 테지만 그땐 그랬다. 제작 완성을 한 광고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해 통과돼야만 방송 송출이 가능했다. 헌데 심의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 부재로 조건부통과에 그쳐 완성된 광고를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던 시기가 있었다.
방송광고 심의 규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방송윤리위원회와 방송사에서 자체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대에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담당했었다. 그리고 2000년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위해 이 업무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했었다.
한국광고주협회를 비롯한 광고단체들은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기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1994년 처음으로 청구된 헌법소원이 각하된 후, 세 차례나 더 위헌소송을 제기해 마침내 2008년 6월 26일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또한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광고계 원로들은 “사전심의 이전과 이후의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크게 달라졌다. 최근 국제광고제에서 우리 광고가 선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 광고의 퀄러티가 발전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방송광고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방송광고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있고, 제약, 의료, 보험 등 일부 업종에서는 관련 협회에서 자율적 광고심의를 시행하고 있다.